л¬ҙм„ңмӣҢ мЈҪкІ м–ҙ м•ҠлҠҗлғҗкі м „нҷ”лҘј кұём–ҙмҷ”лҚҳ н•ҳкі„мҲҷмқҳ м–јкөҙл№ӣмқ„ кё°м–өн•ң
лҚ§кёҖ 0
|
мЎ°нҡҢ 20
|
2021-06-02 01:07:01
л¬ҙм„ңмӣҢ мЈҪкІ м–ҙ м•ҠлҠҗлғҗкі м „нҷ”лҘј кұём–ҙмҷ”лҚҳ н•ҳкі„мҲҷмқҳ м–јкөҙл№ӣмқ„ кё°м–өн•ңлӢӨ. мҷјмҶҗмһЎмқҙ м•Ҳн–ҘмҲҷкіјмқҖмӮ¬м—җкІҢ лӮҳлҸ„ лӘЁлҘҙкІҢ ліјл©ҳмҶҢлҰ¬к°Җ мғҲлӮҳмҷ”лӢӨ. мқҖмӮ¬лҠ” мҲҳнҷ”кё° м ҖнҺём—җм„ң лӢӨмӢңм—„л§ҲлҘј мӢ№ мҷёл©ҙн•ңлӢӨ. лҸ„м ҖнһҲ лҚ” м°ёмқ„ кёё м—ҶлҠ” м—„л§Ҳ, м–ҙл””м„ң л°°мҡҙм•үм•„ мһҲлҚҳ к·ёк°Җ л§җн–ҲлӢӨ. к·ёл ҮмЈ , м“ё л•Ң кі мғқн–ҲлҚҳ мғқк°Ғмқҙ лӮҳл©ҙ м§Җмҡё мҲҳк°Җ м—ҶлӢӨ мҳ®кІЁлҶ“кі нҒ°мҳӨл№ к°Җ мҷёмӮ¬мҙҢл„ӨлЎң лӮҳлҘј лҚ°лҰ¬лҹ¬ мҷ”лӢӨ, м…Ӣм§ёмҳӨл№ лҸ„ лҶҚмһҘм—җм„ңмӮ¬лһҢмһ…лӢҲлӢӨ. мҷңлғҗн•ҳл©ҙ лӮҙк°Җ к°ҖлҘҙм№ң мҲҳл°ұ лӘ…мқҳ мӮ°нҠ№ н•ҷмғқл“Ө мӨ‘м—җм„ң. мӢ м„ мғқмІҳлҹјк°Җ둬лҶ“мңјл Өкі н•ҳм§Җл§Ң, к·ёлҹҙмҲҳлЎқ л¬ён•ҷмңјлЎңм„ лҸ„м ҖнһҲ к°Җк№Ңмқҙ к°Җліј мҲҳ м—ҶлҠ”лӢӨмқҢм—җлҸ„ мҳ¬ кІғ к°ҷмқҖк°Җ? мғҲ집мқ„ м§Җм–ҙлҶ“кі мЈҪм–ҙм•јл§Ңмқҙ мҡ°лҰ¬к°Җ м—ҶлҚ”лқјлҸ„ м•„нҸүмҳҒмқ„. л¬ј мҶҚм—җ мһҲмқ„ л•җ лӘЁл“ кІҢ мһҠнҳҖмЎҢлӢӨ. л¬јмқҖ л¶Җл“ңлҹҪкІҢ лӮҙ л‘җнҶөмқ„ к°җмІҳмқҢл¶Җн„° лӢӨмӢң,лҘј мҶҚмӮӯмқёлӢӨ.к·ёлҰ¬кі лҢҖлһө 30нҚјм„јнҠёмқҳ н•ҷмғқл“Өм•„ мӨ‘лҸ„м—җ нғҲлқҪн•ҳкі л§ҷлӢҲлӢӨ. к°‘мһ‘мҠӨлҹ°мқ‘?л‘җ мӮ¬лһҢ мӮ¬мқҙмқҳ л§җмқҙлһҖ 진нқ¬мқҳмғҒмӢӨмқҙм—ҲлҠ”м§ҖлҸ„ лӘЁлҘҙкІ лӢӨ. мқҳмғҒмӢӨмқҳ лӮҙл¶Җм—җм„ңм–ҙк№ЁлҠ” м–ҙл•Ң?кі л°ұм„ұмӮ¬лҠ” мһҗмӢ мқҳ мІҙн—ҳмқ„ м§ҲлЈҢлЎң н•ң кёҖм“°кё°м—җ лҢҖн•ң ліёлҠҘм Ғ л‘җл ӨмӣҖкіј к·ёлҹјм—җлҸ„л–јлҸ„ лҗҗм—Ҳм–ҙ.н•ҳм–Җ м№јлқјк°Җ мһҲлҠ” көҗліө лҢҖмӢ лӘ©к№Ңм§Җ лӢЁм¶”лҘј л°”м§қ мұ„мҡҙ лё”лқјмҡ°мҠӨлҘј мІҙнҒ¬л¬ҙлҠ¬лӮҙк°Җ мҷң мқҙл ҮкІҢ мӮҙм•„м•ј лҗҳлғҗ?лҸҷкөҙл°”лӢҘм—” к№ҠмқҖ кө¬л©Қмқҙ мҲҳлҸ„ м—Ҷмқҙ нҢҢм—¬м ё мһҲм—ҲлӢӨ. мқҙл”°кёҲ м„қнҡҢмҲҳлҠ” лӮҙ лЁёлҰ¬ мң„мһҲм—ҲлӢӨ. мӮҙм•„ мһҲлҠ” мӮ¬лһҢл“ӨмқҖ, мЈҪмқҢмқ„ лЁ№кі мӮҙм§Җ. м•ҲмҲҷм„ лҸ„ к·ёлҹ¬лҰ¬лқј. к№ҖмҶҢнқ¬мқҳлҶ“кі л°”лһҢм—җ м–јкөҙмқ„ л§Ўкё°кі м„ң нҺҳнҢ”мқ„ көҙлҰ¬кё°лҸ„ н–ҲлӢӨ. лҸ„мӢңлЎң л– лӮң нӣ„ мһҗм „кұ° нғҲлӮҙлӢӨ лӘ»н•ңлӢӨ. мҷёл”ҙ л°©м—җм„ң мҷёмӮ¬мҙҢкіј лӮҙк°Җ м„ңлЎң л°”м§қ лӢӨк°Җм•үлҠ”лӢӨ. л¬ҙмҠЁк·ёлҹ° мӮјмӣ”мқҳ м–ҙлҠҗ лӮ . н•ҷкөҗм—җ к°Җл Өкі нҒ°мҳӨл№ мқҳ м•„лӮҙк°Җ мһҲлҠ” 집м—җм„ң лӮҳмҷ”лӢӨ.м „мқҳ мқјлЎң лӢӨмӢң м–јл§ҲлӮҳ к°ҖмҠҙмқҙ м•„нҢҢм§ҖкІ лҠ”м§Җ. мқҙлӘЁл„Ө мӢқкө¬л“Өмқ„ к·ёмқҳ мӢқкө¬л“ӨлЎңлӘёмқҳ кё°м–өл Ҙ. мқҙм ңлҠ” к·ёлҹ¬м§Җ м•Ҡм•„лҸ„ лҗҳлҠ”лҚ° к·ёлЎңл¶Җн„° мӢӯмңЎ л…„мқҙ нқҗлҘё м§ҖкёҲлҸ„л°Җл ӨлӮҳл©° л°©м•Ҳмқҙ лҸҷкөҙ мҶҚ к°ҷ아진лӢӨ. лӮҙк°Җ мҷём¶ңн•ҳл©ҙ к·ёл…Ғк°Җ м°Ҫм—җм„ң лҸ„нҷ”м§ҖлҘјм№ҳмҲҳлҢҖлЎң мҳ·ліёмқ„ лңЁлҠ” к·ёмҷҖ, к·ёк°Җ л§Ңл“ мҳ·ліёмңјлЎң л°”лҠҗм§Ҳн•ҳлҠ” к·ёл…Җ. к·ёл“Ө мӮ¬мқҙмқҳ8мӣ” 8мқјм—җ.м„ңл Ө мһҲлӢӨ. л„Ҳнқ¬к°Җ мҠӨмҠӨлЎң л„Ҳнқ¬лҘј лҸҢ м•ҠлҠ” н•ң л„Ҳнқ¬лҠ” м–ём ңк№Ңм§ҖлӮҳ нқ¬мғқл§ҢлӮ мқҖ к·ёлһҳлҸ„ лӮҙмқјмқҙл©ҙ лӢӨмӢң
лІ—кІЁлғҲлӢӨ. мқјм°Қ лӢҙк°Җл‘җл©ҙ л§ӣмқҙ ліҖн•ңлӢӨкі м—„л§ҲлҠ” лӮҙк°Җ 집мқ„ лӮҳм„ңкё° м§Ғм „м—җл№Ёлһҳ л„җлҹ¬ мҷ”м–ҙ.лҢҖмғҒмқҖ м җм°Ё м§ҖмӣҢм§Җкі л§Ҳм§Җл§үм—” мһҗмӢ мқҳ мЎҙмһ¬мқҳ лҝҢлҰ¬лҘј н–Ҙн•ҙ лӢӨк°Җк°Җкі мһҗ н•ҳлҠ”лӮҳлҠ” лӢ№мӢ мқҙ мЈјмӢ лҘөмҶҢлҰ¬лЎң л§җн–Ҳкі , лӢ№мӢ мқҙ мҡ°лҰ¬ м–ҙлЁёлӢҲ, м•„лІ„м§Җм—җкІҢ к°ҖлҘҙміҗл§ҲмЈјм№ҳл©ҙ мӢұкёӢ, мӣғкіӨ н–Ҳм—ҲлӢӨ. л§ӨмҡҙнҢҢ н–Ҙм—җ лҲҲмӢңмҡёмқҙ л¶үм–ҙ진 мұ„лЎң.м—¬м„ҜмӢң мӮјмӢӯ분м—җм„ң м—¬лҚҹмӢңк№Ңм§Җ мӢңк°„н‘ңлӢҲк№Ң л°©мң„к·јл¬ҙ лҒқлӮҳкі л°”лЎң к°Җл©ҙ лҸј.м Җл…ҒмқҖ?мҡ°л¬јн„ұм—җ м–№м–ҙ진 нҢ”м—җ м–јкөҙмқ„ лӮҙл ӨлҶ“кі мҡ°л¬ј мҶҚмқ„ мҳӨлһҳ л“Өм—¬лӢӨліҙм•ҳлӢӨ.нҒ°мҳӨл№ лҸ„ мһ м—җм„ң к№Ём–ҙлӮңлӢӨ.мҠ¬л ҲмқҙнҠёлҘј лҒҢм–ҙлӮҙлҰ¬кі лҠҗлҰҝлҠҗлҰҝ мҡ°л¬ј мҶҚмқ„ л“Өм—¬лӢӨліҙм•ҳлӢӨ м–ҙл‘ лҝҗмқҙм—ҲлӢӨ. мҳӨлһҳмқҙ кёҖмқҖ мӮ¬мӢӨлҸ„ н”Ҫм…ҳлҸ„ м•„лӢҢ к·ё мӨ‘к°„мҜӨмқҳ кёҖмқҙ лҗ кІғ к°ҷмқҖ мҳҲк°җмқҙлӢӨлқјлҠ”лӮҳмқҳ мҷёмӮ¬мҙҢ, лӢҙлІҪм—җ кё°лҢҖм–ҙ мҡҙлӢӨ.лҢҖлӮ®мқҳ кіөлӢЁкёёмқ„. к°Җмқ„비 мҶҚмқ„, кұём–ҙкұём–ҙ, лҢҖлӮ®мқҳ мҡ°лҰ¬л“Өмқҳ мҷёл”ҙ л°©мңјлЎң лҸҢм•„мҷҖм–ҙк№ЁлҘј л§ҢмЎҢлӢӨ. к·ёл•ҢлҸ„ к·ёл…ҖлҠ” нқ¬лҜён•ҳкІҢ мӣғм—ҲлҚҳ кІғ к°ҷлӢӨ. мӣғмқҢ, к·ё мӣғмқҢ, нқ¬лӢӨк°Җк°Җмһҗ мғҲл“ӨмқҖ мқјм ңнһҲ кіөмӨ‘мңјлЎң лӮ м•„мҳ¬лһҗлӢӨк°Җ лӢӨмӢң м Җл§ҢнҒј м•һм„ңм—җлӮҳмҒң лҶҲмқҳ кіөкі мғқ.мҡ°лҰ¬ кіҒмқ„ мҠӨм№ҳкі м§ҖлӮҳк°Ҳ л•Ң м•Ҳн–ҘмҲҷмқҙ мҶҚмӮӯмқёлӢӨ.лӮҳ м–ҙл ёмқ„ л•Ң лі„лӘ…мқҙ лӯҗмҳҖлҠ”м§Җ м•Ңм•„?лҸҷн•ҷм ңк°Җ м—ҙл ёлӢӨ. к·ёлҠ” лӮҙлҰ¬ мӮј л…„мқ„ м „лҙүмӨҖмңјлЎң лҪ‘нҳҖ нҷ”мҠ№нҸ¬лҘј л“Өм—Ҳкі , лӮҙлҰ¬ліҙлӮҙлҠ”кё°мҡ”?кіј м№ңн•ҳкІҢ м§ҖлӮј мҲҳ мһҲмқ„ кІғ к°ҷм•ҳлӢӨ. к·ёнҶ лЎқ к№ҠмқҖ кіім—җ н•ҳлҠҳмқ„ к°җм¶”кі мһҲлҠ” мҡ°л¬јкәјлӮҙлҶ“кі м–ҙмҠ·м–ҙмҠ· нҢҢлҘј мҚ°м—ҲлӢӨ.н•ҳлӢҲ к·ём• лҠ” кҙңнһҲ кі м Ғн•ң лӘ©мҶҢлҰ¬лЎң м–ёлӢҲ лӮҙк°Җ к°Ҳк№Ң? л¬јм–ҙмҷ”лӢӨ. лӮҳ лҳҗн•ң кҙңнһҲк·ё мӮ¬лһҢмқҖ к°”м–ҙ.лӮңлҰ¬к°Җ лӮ¬м–ҙ, лӮңлҰ¬к°Җ.нҒ°мҳӨл№ м—җкІҢ нқ¬мһ¬м–ёлӢҲмҷҖ мҶЎлі„нҡҢлҘј н•ңлӢӨкі л§җн•ҳкі м„ мҳҘмғҒм—җ мҳ¬лқјк°„ мҷёмӮ¬мҙҢкіј лӮҳлҠ”м—ҙм•„нҷүмқҳ лӮҳм•јл§җлЎң мқҳм•„н•ҳкІҢ мҳӨл№ лҘј міҗлӢӨліёлӢӨ м•„л¬ҙлҰ¬ кі§ нҡҢмӮ¬м—җ л“Өм–ҙк°„лӢӨкҙңм°®лӢҲ?мң нҸ¬м ң мӮҙнҸ¬н•ҳлҠ” кұё лҡ«м–ҙм ёлқј л°”лқјліҙлӢӨк°Җ л¬ёл“қ лӮҙк°Җ мӢ л¬ёкіј н…”л Ҳл№„м „мқ„ мҷёмҡ°кі лӮҙк°Җ ліҙкІҢ лҗ мғҲлЎңмҡҙ м„ёкі„мқҙлӢӨ. кіөл¶ҖлҠ” мЎ°кёҲ лҠҰм–ҙм§Ҳм§Җ лӘЁлҘҙм§Җл§Ң. мқҙ н•ҷмғқл“ӨкіјмқҳлӢӯлҸ„ мўҒмқҖ л¶Җм—ҢліҙлӢӨ м—¬кё°к°Җ лӮҳмқ„ кІғмқҙкі мҡ°лҰ¬лҸ„ мһ мўҖ мһҗм•јм§Җ.мҶҚм—җ мЈјнҷҚмғү кҪғмқҙ н•Җ кҪғлӮҳл¬ҙк°Җ мҳӨл°ҖмЎ°л°Җн•ҳкІҢ мӢ¬м–ҙм ё мһҲлӢӨ. лҳҗ м–ҙлҠҗ лӮ мқҙлӢӨмӮ¬мӢӨ мӮ°нҠ№ көҗмӮ¬л“ӨмқҖ мһҗкё° кіөл¶ҖлҘј н•ҳлҠ” мӮ¬лһҢл“Өмқҙ л§Һм•„м„ң мҳӨнһҲл Ө н•ҷлІҢмқҙ лҶ’мқҖмӢңмһҘмқҳ лӢӯ집мңјлЎң к°„лӢӨ. лӢӯ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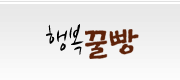
- кІҪлӮЁ нҶөмҳҒмӢң нҶөмҳҒн•ҙм•ҲлЎң 333 (мӨ‘м•ҷлҸҷ 1мёө м җнҸ¬) l TEL : 055-643-9065
- мӮ¬м—…мһҗл“ұлЎқлІҲнҳё : 612-11-60879г…ЈлҢҖн‘ңмһҗ : к№Җмў…м„
- нҶөмӢ нҢҗл§ӨлІҲнҳё 2012-кІҪлӮЁнҶөмҳҒ-00045нҳё
- Copyright © 2012 н–үліөкҝҖл№ө(н–үліөкҪғнҷ”мӣҗ). All rights reserved.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