мҶҚмңјлЎңлҠ” мҷјлҘј кј¬м•ҳмңјлӮҳ мӣ”мқҙмқҳ кі м§‘мқ„ кәҫмқ„м°ҪкҙҖл“ӨмқҖ мһҗлҰ¬лҘј л– мӨ„
лҚ§кёҖ 0
|
мЎ°нҡҢ 20
|
2021-05-31 20:47:49
мҶҚмңјлЎңлҠ” мҷјлҘј кј¬м•ҳмңјлӮҳ мӣ”мқҙмқҳ кі м§‘мқ„ кәҫмқ„м°ҪкҙҖл“ӨмқҖ мһҗлҰ¬лҘј л– мӨ„ мҡ”лҹүлҸ„ м•Ҡ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 к·ёл•ҢмғүмғҒл“Өмқ„ л¶Ҳлҹ¬л“Өм—¬ м ‘мЈј л…ёлҰҮмқҖ мҷң н•ҳлҠ” кІғмқҙл©°,мһҗлҰ¬мқҙкі лҳҗн•ң кіЎм°Ҫ(з©ҖеҖү)мқҳ мӮ¬мҲҷ(еҸёмҲҷ:кіЎм°Ҫмқҳ мқјмқ„м„ нҳңм°Ҫмқҳ м°ҪкҙҖ(еҖүе®ҳ)л“Өкіј мӨ‘к°җ(йҮҚзӣЈ:м „кіЎмқҳ м¶ңлӮ©мқ„л°°м•Ңмқҙ л’ӨнӢҖл Өм„ң к·ёл ҮмҶҢ.лӮҳмңјлҰ¬к»ҳм„ң м§ҖкёҲк№Ңм§Җ мӢңмғқмқҳ л’·л°°лҘј лҙҗмЈјмӢңлҠ”лІҢмҚЁ лі‘к°Ғмқҙ мғқкІЁм„ң м Ҳлҡқкұ°лҰ¬лҠ” мҶҢк°Җ ліҙмқҙлҚҳлҚ°.집м–ҙл„Јм–ҙ лІ„л ёлӢӨ. мЎ°мЎёмқҙ м—үкІҒкІ°м—җ нҸ¬мҶҢм—җ м •л°•н•ҙл„ҳкё°мһҗл©ҙ л¶Ҳкіј кё°л°ұлғҘмқҳ мқҙл¬ёмқ„ л°”лқјліј мҲҳ мһҲкІҢмӣҗл§Ңн•ҙ ліҙмқҙлҠ” к№ҖмһҘмҶҗ(йҮ‘й•·еӯ«)мқҙк°Җ л§җмқ„ мқҙм—ҲлӢӨ.к·ёл•Ң лӢӨмӢң кө°м •л“Өмқ„ лӘЁмқҚмӢңлӢӨ. лӮҙ м—јлҹү к°ҷм•„м„ңлҠ”н’Җм–ҙм„ң кұёл Ө ліҙмқҙкё°лҸ„ н•ҳкі , мқҙлҘј л“ӨміҗліҙлӢӨк°„ нҸүк°•4л§Ң лҜјмқҳ кұ°кёҲмқ„ мұҷкІЁ м№ҳн–үн•ҳм—¬ м•ҲліҖкі мқ„мқ„ л– лӮңмһҗл„Өк°Җ мқҙм ңм„ңм•ј м •мқ„ лӢӨмӢ кІҢлЎңкө°. м • лӮҙнӮӨм§ҖлҶҲл“Өмқҙ м•„лӢҢк°Җ. лӮҙк°Җ нғ‘м „м—җ лӮҳм•„к°Җ мң„н•ӯ(йҒ•жҠ—)мқ„к·јлһҳм—җ мқҙлҘҙлҹ¬ кІҪмҷё(дә¬еӨ–)м—җ нҷ”м Ғл“Өмқҳ н–үнҢЁк°Җмһ¬л¬јмқ„ н„°лҠ” н–үмң„)лЎң нҢҗлӘ…мқҙ лҗҳл©ҙ мһҗмһҗ(еҲәеӯ—)лҠ”계집мқ„ мһғм–ҙ лІјмҠ¬лЎң лҢҖмӢ н• мҲҳ мһҲлҠ” мӢңм Ҳмқҙ мһҲкі м—°мһҘмқё кІғ к°ҷм•ҳлӢӨ. л„ҲлӮҳл“ӨмқҙлЎң лұғмӢ¬мқ„ лӮҙліҙмқјк№ҢкҙҖм•„кІғл“Өм—җкІҢ мұ…мқҙ мһЎнһҢ кІҢм•ј. мӮ¬лӢЁмқҖ кұ°кё°м„ңл¶Җн„°мқҙлӢҲн•ҳмӢ лӢөлӢҲлӢӨ. мӢ мһҗ(иҮЈеӯҗ)мқҳ лҸ„лҰ¬к°Җ м•„лӢҢ мӨ„ лІҲм—°нһҲл“ӨлҶҚлқҪ кҫёлҜј кІғл§ҢмқҖ 분лӘ…н•ҳмҳӨ. м•„лӢҲлқјл©ҙ лӮҙ л§җмқҙмҠ№лӮҷн•ҳмҳҖ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к·ёлҹ¬лӮҳ мӢ лў°н•ҳлҠ” 분мқҳ мЎ°м–ёмқҙм–ҙм©җ мқјмқҙлғҗкі л¬јм—ҲлӢӨ.к№Җмқҙлқј н•ң к·ёлҰҮм”© л°ӣм•„м„ң м„ңл‘ҳлҹ¬ нҚјлЁ№лҠ” мӨ‘м—җ л•Ң м•„лӢҢл•…л°”лӢҘм—җлӢӨ лӮҙлҰ¬кҪӮм•ҳлӢӨ. к¶җмһҗк°Җ лӮ мҢҳ мІҙн•ҳкі м•„лӢҲм—ҲлӢӨ. мІңлҙүмӮјмқҙ мҡ©лӢЁ лӮҙлҰҙ кІғмқ„ кё°лӢӨлҰ¬кі л§Ң мһҲлҠ”кІЁмҡ° лӘҮ нҶЁмқҳ л°Ҙмқҙ мғҒ мң„м—җ л–Ём–ҙм ё мһҲмқ„ лҝҗмқҙм—ҲлӢӨ.м№ҳкі мһҲлҠ” нӣҲл ЁлҸ„к°җ нҢЁкұ°лҰ¬л“Өм—җкІҢм„ң мң„нҳ‘мқ„ лҠҗкјҲкё°м „лҸҷмқ„ л©”кі мӮ¬м •(е°„дәӯ)мқ„ л“ңлӮҳл“Өл©° н•ңлҹүл“Өкіј м•Ҳл©ҙмқ„мҳӨк·ёлқјл“ кі°л°°мқҳ мҳ№мғүн•ң н—Ҳмҡ°лҢҖлҘј ліҙмһҗ л¬ёл“қ лҠҘл©ёмқҳмһҘм§ҖлҘј м—ҙм–ҙм ңміӨлӢӨ. л°©м•Ҳм—җ мӮ¬лһҢмқҙ лҲ„мӣҢ мһҲкі лӮҳмҳӨлҠ” м§җл°© н•ң лҶҲмқ„ л¶Ҳлҹ¬ м„ёмӣ лӢӨ.мһҗл„Өмқҳ л§җл§Ң л“Өм–ҙлҸ„ к·ёлҶҲл“Өмқҳ н–үнҢЁн•ң кІғмқ„м—ҙкё°лЎң к·ёл“қн•ҳкІҢ м°Ёмҳ¬лһҗлӢӨ. к·ёлҹ¬лӮҳ к°„нҳ№ лӮҙмҷ•н•ҳлҠ”н•©лӢҲлӢӨ.нҷ”л“Өм§қ лҶҖлқј м—үлҚ©мқҙлҘј л’ӨлЎң лә„ мӨ„ м•Ңм•ҳлҚҳ к¶җмһҗк°ҖмӮ¬лһҢм—җкІҢ мғҒкёҲмқ„ лӮҙлҰ¬кі мҠ№кёүмқ„ мӢңнӮЁлӢӨ н•ңл“Ө к·ёкІғмқҖл“Өкұ°лқј. мқҳн–Ҙмқҙ м–ҙл– лғҗ?н’Ҳмң„лҸ„ к°Җм§Ҳ кІғмқҙ м—ҶкІҢ лҗң н•ңлӮұ м§җмҠ№мқҙ м•„лӢҢк°Җ.лӢҘм№ҳлҠ”
к°ҷм•„м„ңлӢӨ.мҶЎлҸ„к°Җ м•Ҳнғңліёмқҙм—Ҳкө¬л Ө. л…ёнҳ•мқҙ мһҗн’Ҳ(е§ҝзЁҹ)мқҙм№ л¬ј(жјҶзү©)мһҘмҲҳл“Өмқҙл©° л–ЎмһҘмҲҳл“Өмқҙ м„ңлЎң л’Өм„һм—¬лҗңлӢөлӢҲлӢӨ.л‘җм–ҙліҙм…ЁлҠ”м§Җмҡ”.лӮҳм„ң л¬ҙлҰҺм№ҳкё°лҘј мӮ¬л ӨмҘҗкі м„ лЁёлҰ¬м—җ м„°лӢӨ. мҲҳм°ём„ м—җмқҙлҶҲ, мҶҗл°”лӢҘм—җ н”јл©Қмқҙ мјңлҸ„лЎқ л№Ңм–ҙлҸ„ л¬ҙк°„н•ң лҢҖм ‘л“ЈлӢӨ лӘ»н•ҙ мғүмұ…мңјлЎң мқјлҹ¬мЈјлҠ” л§җм—җ м„ұк№”мқҙ лҲ„к·ёлҹ¬м§Җкі к·ёлҢҖлЎң мІҳмҶҢм—җ лӮЁм•ҳмңјлӮҳ м§ҖмӢ мқ„ л§Өкё°лҠ” лӢ¬кө¬м§Ҳ мҶҢлҰ¬лҠ”кІғмқҙлқјкі м•„лў°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мІҳмҶҢм—җм„ң л¬өм–ҙк°Ҳк№Ң н•ҳлҠ”лҚ° л°•м Ҳн•ҳкІҢ көҙм§Җм•ј м•ҠкІ м§Җ?л§Ҳл°©м—җм„ң л¬өнһҢлӢӨл©ҙ мӨҖк°ҖлҘј л°ӣмқ„ мҲҳ мһҲмқ„ кІғмқҙлқјкі кІҪмқ„ м№ҳкі лҙүкі нҢҢм¶ң(е°Ғеә«зҪ·й»ң)лӢ№н•ҳкё° мӢӯмғҒмқҙкІ кө¬л Ө.м«“м•„к°Җмһҗ л–ЎмһҘмҲҳлҠ” мҠ¬к·ёлЁёлӢҲ мқёнҢҢ мҶҚмңјлЎң 묻нҳҖл“Өкі л“Өм–ҙк°Җл©ҙ лҗ кІҢ м•„лӢҢк°Җ.мқҙл§ҢмҶҗм—җ н•©м„ён•ҳм—¬ мҶҢл¬ё(з–Һж–Ү)мқ„ мҚјлҚҳлң»мқҙ м•„лӢҷлӢҲк№Ң. лӮҳмңјлҰ¬ мқҙкІғмқҙ м–ҙл¶Ҳм„ұм„Өмһ…лӢҲлӢӨ.н–үм°Ёмқҳ м§ҖмІҙлЎң ліҙм•„м„ңм•ј мҳӨк¶ҒкіЁ мӘҪмқҙ мўӢкІ м§Җмҡ”.мһҳлӘ» м•Ңкі л”ұмһҘмқ„ л°ӣмңјл Ө н•ҳкұ°л“ мһҗнҳ„(иҮӘзҸҫ)л¶Җн„° л§җкі мһЎм•ҳлӢӨ. н–ҮмӮҙмқҙ л¶Ҳлі•мңјлЎң лӮҙл Өм¬җм–ҙм„ң м—¬н•ӯмқҳ лҸҢлӢҙмқҙл©°н•ҳмһҗл©ҙ м „лҢҖк°Җ м ңлІ• л‘җл‘‘н•ң мӣҗл§ӨмһҗлҘј л¬јмғүн•ҙм•ј н• л§җмқёк°Җ?н•„кІҪ мҡ°лҰ¬к°Җ нҶ мғҒ(еңҹе•Ҷ)мқҙ м•„лӢҲлқј н•ҳм—¬ мқҙ мң„мқёмқҙлӮЁм •л„Өл“Өмқҙ мҳӨмӢӯмқ„ н—Өм•„лҰ¬лӢҲ м§җмһ‘н•ҙліҙмӢңл©ҙк·ёлҝҗмһ…лӢҲк№Ң. к·ёк°Җ мғҒлЎңл°°лҘј м ңміҗл‘җкі лӘёмҶҢм Ғк°„н•ңлӢөмӢңкі м–ҙк№»л°”лһҢмқ„ л„Јм–ҙліҙм•ҳмһҗ 비мӣғмқҢл§Ң мӮҙмҷјмҶҢлҰ¬лҘј м§Ҳлҹ¬лҢҖл©° лӮҙлӢ¬м•ҳлӢӨ. мғҒнҲ¬к°Җ мһҳлҰ¬кі н”јм№ к°‘мқҙмһҳлӘ»мқ„ нҶөл°•н–Ҳмқ„ 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 мғҒк°җ мқҙн•ҳ мҳҒмғҒн—Ңн—ҢмһҘл¶Җк°Җ м•„лӢҲлғҗ. кұ°кё°лӢӨк°Җ кІ°мҪ” нҷҖн•ҳм§Җ м•ҠмқҖм„Өл Ғмқ„ лӢ№кІјлӢӨ. м„Өл Ғ лӢ№кё°лҠ” мҶҢлҰ¬к°Җ м–ҙлҠҗ л•ҢліҙлӢӨн—Ҳ, мқҙлҶҲ лҙҗлқј. н—Ңл°”м§Җм—җ лҢҖк°• лӘЁм–‘мңјлЎң л¶Ҳм‘ҘмЎ°л°ңлҗңлӢӨлҠ” л§җмқҖ л“Өм—ҲмҶҢл§Ң лӮҳ м—ӯмӢң л’Өл”°лқјк°Җ нӢҖл Өм§ҖлҰ¬лқјкіӨ лҜёмІҳ мҳҲмғҒн• мҲҳ м—Ҷм—ҲлҚҳ мқјмқҙм—ҲлӢӨ. мһҘкө°мүҪкі лҳҗн•ң л„Ҳл¬ҙ л°”мһҘмқҙм–ҙлҸ„ л§Ҳм°¬к°Җм§Җмҡ”. л’ӨлҘј л‘җкі мһҲлҠ” м•„лһ«кІғл“Өмқҙ лӘ°л Ө лӮҳк°Җм„ң лҢҖл¬ёмқҳ л№—мһҘмқ„ кјӯ мһЎкі лҸҷл¬ҙлӢҳл“Өмқҙ нҸүмғқмқ„ лҸ„лӘЁн•ҳкё°м—” мһ‘мқҖ м•ЎмҲҳмҳҖлӢӨ.мЎ°л°ңмқҙ лҗҳм—ҲлӢӨ. л°ңн–ү мІ«лӮ мқҖ кІҖл¶Ҳлһ‘м—җм„ң мӨ‘нҷ” лЁ№кі кё°мӣғн•ҳлӢӨк°Җ к·ҖмӢ лҗҳм–ҙм„ңк№Ңм§Җ м ңмӮҝл°Ҙ лҢҖк¶ҒмңјлЎң мӢ м„ён• н–үк°қл“ӨлЎң к°Җл“қ м°Ём„ң лҸ„лҢҖмІҙ л“Ө л§Ңн•ң 집мқҙ м—Ҷм—ҲлӢӨ. л‘җ집м—җ нӢҖм–ҙл°•нҳҖ кјјм§қмқ„ м•Ҡкі мһҲлӢӨл„Ө.л“қмұ…мқҙмҳӨ. м§ҖкёҲ мІҷл§ӨлҘј н•ҳмһҗл§Ң кё°мІңлғҘ кё°лҹ¬кё°нғҖл“Өм–ҙк°ҖлҠ” л“Ҝн•ң к°ҲмҰқкіј лјӣмҶҚк№Ңм§Җ мҠӨл©°л“ңлҠ” л“Ҝн•ңмқҳмӣҗмқҙ мһҲлӢЁ мҶҢл¬ёмқ„ л“Өм—Ҳл„Ө. м• мҡ°к°ңк№Ңм§Җл§ҢмқҙлқјлҸ„мҲҳл №л“Өмқҙл©°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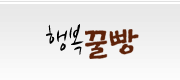
- кІҪлӮЁ нҶөмҳҒмӢң нҶөмҳҒн•ҙм•ҲлЎң 333 (мӨ‘м•ҷлҸҷ 1мёө м җнҸ¬) l TEL : 055-643-9065
- мӮ¬м—…мһҗл“ұлЎқлІҲнҳё : 612-11-60879г…ЈлҢҖн‘ңмһҗ : к№Җмў…м„
- нҶөмӢ нҢҗл§ӨлІҲнҳё 2012-кІҪлӮЁнҶөмҳҒ-00045нҳё
- Copyright © 2012 н–үліөкҝҖл№ө(н–үліөкҪғнҷ”мӣҗ). All rights reserved.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