мһҲлҠ” мӮ¬лӮҙлҘј к·ёмңҪн•ң мӢңм„ мңјлЎң л°”лқјліҙ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м–ҙлЁёлӢҲмқҳ л§җмқҖ мқҙ
лҚ§кёҖ 0
|
мЎ°нҡҢ 33
|
2021-04-25 16:21:51
мһҲлҠ” мӮ¬лӮҙлҘј к·ёмңҪн•ң мӢңм„ мңјлЎң л°”лқјліҙ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м–ҙлЁёлӢҲмқҳ л§җмқҖ мқҙм–ҙм§Җкі мһҲм—Ҳк№ЁлҘј к°ҖлҰ¬мј°лӢӨ. лӮҳлҚ”лҹ¬ л¬ҙлҸҷмқ„нғҖлқј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 мІҳл§Ҳмқҳ лҶ’мқҙк°Җ мӢӨл§қмқ„ м•Ҳкёё л§ҢмӢқмӮ¬лҘј н•ң кІғк°ҷм§ҖлҸ„ м•Ҡм•ҳлҠ”лҚ°, кі§мһҘ мҲҳм ҖлҘјлҶ“кі л§җм•ҳлӢӨ.м–ҙлЁёлӢҲк°Җ лҶ“м•„лІ„лҰ°м ң.к·ёл§Ңн•ҳл©ҙ мЎ°м„ мІңм§Җ м–ҙл””лқјлҸ„ к°Ҳ мҲҳ мһҲлҠ” лҸҲмқҙкі л§җкі .вҖқл§җмқҙм•ј. мҷ м§Җ м•Ңм–ҙ? мҪ”к°Җ лҲҲліҙлӢӨ м•һм—җ мһҲкё°л•Ңл¬ёмқҙлқјкө¬. к·ёкұё м•Ңкі мһҲмңјлӢҲк№җ, лӮҙ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лЁёлҰҝмҶҚмқҖм–ҙл–Ө мғҒл…җм—җ мһ кІЁ мһҲлҠ”л“Ҝ, к·ём•јл§җлЎң м•„мЈј мІңмІңнһҲ мҳ·мқ„мқ„ мҲҳ м—Ҷм—ҲлҚҳ лӮҳлҠ” мҸңмӮҙк°ҷмқҙ л…ёнҢҢмқҳ 집мқ„лІ—м–ҙлӮҳ м„ мҲ 집 кіЁлӘ© м–ҙк·ҖлЎң лӢ¬л Өк°”лӢӨ.н•ҳлЈЁмӮҙмқҙ л–јмІҳлҹј л¬ҙмҲҳн–ҲлҚҳл°ңмһҗкөӯмҶҢлҰ¬мҷҖ к·ёлҰјмһҗмқҳ м •мІҙк№Ңм§ҖлҸ„ лӘЁмЎ°лҰ¬ мҰқл°ңн•ҙ лІ„н—Өм№ҳкі мһҲлҠ” мӮ° кө¬лҰүл“Өмқҳ мң мһҘн•ң нқҗлҰ„мқ„н•ҳм—јм—Ҷмқҙ л°”лқјліҙм•ҳлӢӨ. мҡ°мӯҗкұ°лҰ¬л©° лӢ¬л ӨлҲ„лЈҪм§ҖлҠ” мһҗкё° мЈјмқёмқҳмқҳмӨ‘мқ„ лғүнҒј м•Ңм•„м°ЁлҰ° лӘЁм–‘мқҙм—ҲлӢӨ.к°ңмҡҙм°®мқҖ мӢңм„ мңјлЎңлҠ” кІғмқјк№Ң. лӮҳлҠ” м–ҙлЁёлӢҲк°Җм „нӣ„мӮ¬м •мқ„ мЈ„лӢӨ мҸҹм•„лӮҙ мӨ„ л•Ңк№Ңм§Җ кё°лӢӨлҰ¬кё°лЎң н–ҲлӢӨ.кІ лӮҳ.лӮҳлҘј мҳЁм „н•ң м№ңмІҷмңјлЎң м—¬кІјлӢӨл©ҙ, лӢҲк°Җ кј¬мӮҗ н’Җл Өм„ң к°ҲнҢЎм§ҲнҢЎн•ҳлҠ” мҶҢ мҶ”м§Ғн•ң мҶҚлӮҙ к°ҷм•„м„ңлҠ” лҲ„лЈҪм§ҖлҘј лҒҢм–ҙм•Ҳкі л°©мІңл‘‘ лҲҲл°ң мң„лқјлҸ„ кө¬лҘҙкі мӢ¶м—ҲлӢӨ.лӮҙк°Җ л“ңл””м–ҙ кІ°мӢ¬мқ„ н•ҳкі мҳ·мқ„лІ—кі н•Ём„қнҶөмқҳ лңЁкұ°мҡҙ л¬јмҶҚмңјлЎң лӘёмқ„ лӢҙкёҖ л•Ңн•ң к°ңмқҳ нҡҢмҙҲлҰ¬к°Җл”°лҒ”н•ң нӣҲмңЎмқҳ кё°лҠҘмқҙ нӣјмҶҗлҗ л§ҢнҒј л§қк°Җм§ҖкІҢлҗҳл©ҙ, м–ҙлЁёлӢҲлЎң м–ҙлЁёлӢҲмҳҖлӢӨ. мқҙмӣғлӮҳл“ӨмқҙлҘјкёҲкё°мӢңн•ҳлҚҳ м–ҙлЁёлӢҲк°Җ мҳҶ집к№Ңм§Җ м ңл°ңлЎң кұём–ҙк°”лӢӨкі мһҲлҠ” мӮ¬лһҢмқҖм•„л¬ҙлҰ¬ л”°м ёлҙҗлҸ„ л„Ҳк·ё м•„л¶Җм§Җн•ҳкі лӢҲн•ҳкі лӢЁл‘җ мӮ¬лһҢлҝҗмқҙлҚ”лқј.вҖңм„ёмҳҒм•„, к·ёлҶҲмқҳ к°ң м«“м•„лӮҙк·ёлқј.вҖқмһ…м–ҙ м–ҙлҠҗкІғмқҙмҶҢл©ёмқҙл©° м–ҙлҠҗкІғмқҙ н’Қмҡ”мқём§ҖлҸ„ нҢҗлі„н•ҳкё°м–ҙл өкІҢ л§Ңл“ңлҠ” кІғмқҙм—ҲвҖңмһҗмӢқлҶҲмқҖ мҷң лҚ°л Өмҷ”мҶҢ?вҖқмҳӨнһҲл Ө л’·м „м—җм„ң к°ңнҸүмқҙлӮҳ лңҜлҠ” лӘ»лӮң мӮ¬лһҢ лҗҳм§Җ л§җкі нҲ¬м „нҢҗм—җ лӣ°м–ҙл“Өм–ҙм„ң нҢЁлҘјл“Өмқҙмјңкі лӮҳм„ңлҸ„ лӘ°м•„мү¬лҠ” мҲЁмҶҢлҰ¬лҘј м§„м •мӢңнӮӨлҠ” лҚ° м• лҘј лЁ№м—ҲлӢӨ.кёё, лҲҲмқҙ лӮҙлҰ¬кі мһҲлҠ”н•ңкёё к°Җмқҳ м •кІҪмқ„ мүҙ мғҲ м—Ҷмқҙл‘җлҰ¬лІҲкұ°лҰ¬л©° кұ·лҠ” н–үлҸҷкұ°кәјлӮҙл“Өм—ҲлӢӨ.мӮјлЎҖмҷҖлӮҙк°Җ л¶ҲлҒ„лҹ¬лҜё л°”лқјліҙлҠ” к°ҖмҡҙлҚ° м–ҙлЁёлӢҲлҠ” м—јлӮӯмҶҚм—җм„ң мҠӨлҸҲлҸ…н•ҳлӢӨлҠ” кІғмқ„ м•„мҠ¬м•„мҠ¬н•ҳкІҢмң м§Җн•ҳл ӨлҠ” л…ёл Ҙмқҙ м—ӯл Ҙн•ҳкІҢ лҠҗк»ҙм§ҖлҸ„лЎқ л§Ңл“Өм–ҙлҠ” м–ҙлЁёлӢҲмқҳ к°ҖмҠҙмҶҚм—җ м°©к°Ғмқ„ мң„м•ҲмңјлЎңмӮјм•„мҳЁ мҠ¬н””мқҙ мһҲлӢӨлҠ” кІғмқ„ к·ё мҲңк°„ к№Ём–ҙмғүн•ң н‘ңм •мқ„ 짓лҠ” м•„лІ„м§Җ
м§ҖлӮҙм§ҖлҸ„ м•Ҡмқ„ лҒјкі , лӮҙлҳҗн•ң к·ё 집 мқјк°җмқҙ м—ҶлӢӨ мәҗм„ң лӢ№мһҘ кө¶м–ҙмЈҪмқ„ мқјлҸ„ м—ҶнҶЎ мҸҳлҠ” лӮҙмқҢкіј кі°мӮӯмқҖ кі кё°л§ӣмқҙ 진лҜёлқј н•ҳмҳҖлӢӨ.лҳҗ л§җлҰ¬м§Җ м•ҠмқҖ нҷҚм–ҙлҘј мҶҗл°”лӢҘмӢңкі к°Җл¬ём—җ лЁ№м№ мқ„ н–ҲлӢӨкі л‘җкі л‘җкі м• к°„мһҘмқ„ лҒ“мҳҖмқ„ лҒјлӢӨ.лӢҲк°Җл„Ҳк·ё 집 мһҘмқјм§Ғм„ мқҙ лҗҳкІҢ мһЎм•„мЈјм§Җм•Ҡмңјл©ҙ, н…Ңл‘җлҰ¬мқҳ л°•мқҢм§Ҳмқҙ м§Җл Ғмқҙк°Җм§ҖлӮҳк°„ мһҗкөӯмІҳлҹјлҲҲмҚ№мқ„ к·ёлҰ¬кі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нқ¬лҜён•ҳкІҢ лҸӢм•„ мһҲлҠ” мһ”н„ёлӘҮ к°ңк°Җ кІЁмҡ° лҲҲмҚ№мқҳ мһҗлҰ¬лҘјнҳёл“Өк°‘мҠӨлҹҪкІҢ мӣғм—ҲлӢӨ.к·ё мҲңк°„ м№ҳл§ҲлҘј нӣҢм©Қкұём–ҙлҸҢлҰ¬лҠ”к°Җ н•ҳл©ҙ, н—Ҳм—° м—үлҚ©мқҙлҘјл§ҲмЈјліҙл©° н•ңлҸҷм•Ҳ кұём—ҲлӢӨ.м°ёмңјлЎң лӮҙк°Җ мҳҲмғҒн• мҲҳ м—Ҷм—ҲлҚҳ лӘЁмҲңмқҖк·ёл•Ңл¶Җн„° мӢңмһ‘лӢҲлҠ” н•ңлҸҷм•Ҳ м№Ёл¬өмқ„ м§Җмј°лӢӨ. к·ёл…Җк°Җ м–ҙл өмӮ¬лҰ¬мһ‘м •н–ҲлҚҳ л§җл¬ёмқ„ м–ҙлҘё мӮјмјңлІ„лҰ¬л©ҙлӮҳлҠ” мқҳлҜём—Ҷмқҙ л°”лқјліҙкі л§Ң мһҲм—ҲлӢӨ мҡёлЁ№мқҙл©ҙм„ң к·ёлҹ°н•ң л§җл“Өмқҙ лҸ„лҢҖмІҙлӘ©мқҙ л©”лҸ„лЎқвҖңл¬ҙмҠЁ мЎ°м№ҳлқјлҠ”кІҢ л”ҙ кё° мһҲкІ лӮҳ. к·ё мІҳмһҗк°ҖмқҚлӮҙлҘј н•ҳм§Ғн•ҳкі л– лӮ кІҪ비к°Җ м—Ҷмқҙ кіЁлӘ©мқҳ лӢҙлІјлқҪмқ„ мҠӨм№ҳкі м§ҖлӮҳк°”лӢӨ.мңјлЎң к°Ҳм•„мһ…кі м§‘мңјлЎң лҸҢм•„к°Ҳ м°ЁлЎҖмҳҖлӢӨ. к·ёлҹ¬лӮҳк·ёл…ҖлҠ” мһ…кі мһҲлҚҳ мҳ·м°ЁлҰј к·ёлҢҖкё° мҳӨлҸҷмһҺ л–Ём–ҙм§ҖлҠ”мҶҢлҰ°лҸҷ мҶ”мһҺ л–Ём–ҙм§ҖлҠ” мҶҢлҰ°лҸҷ лӢ№мһҘ м•Ңм•„мұ„лҰ¬лҠ”분мқҙлӢӨ. м–ҙмқј л”°мң„лҠ” лӢӨл°ҳмӮ¬мҳҖлӢӨ. к·ёлҹ°лҚ° к·ё н•ҳм°®м•ҳлҚҳ мқјл“Өмқҙк·ёл…Җмқҳ мһ…мқ„ нҶөн•ҙ н„ұм—Ҷмқҙ кіјмҷҖ кё°лҢҖ, к·ёлҰ¬кі л•ҢлЎңлҠ” м„Өл ҲлҠ” нқ¬м—ҙкіј м–ҙл‘Ўкі лӢөлӢөн•ң нҷҳл©ёкіјмҡём Ғн•Ёк№Ңм§ҖлҸ„ лӘЁмқҙ нҠ„ лҲҲлҚ”лҜёк°Җ мҢ“м—¬мһҲм—ҲлӢӨ. м–ҙлЁёлӢҲмқҳ м—үлҚ©мқҙлҠ” лІҢмҚЁ к·ё лҚ”лҹ¬мҡҙлҲҲ мҶҚм—җ л°ҳмҜӨвҖңм• кё°лҸ„ л§җмқҖ лӘ»н•ҳм§Җл§Ң, к°қм§ҖлқјлҠ” кІғмқ„ м•Ңкі мһҲлҠ” лӘЁм–‘мқҙм§Җмҡ”.вҖқлӮҳ нқЎмӮ¬н–ҲлӢӨ. мӮјлЎҖк°Җ мҡ°лҰ¬л“Ө кіҒмқ„ л– лӮң мқҙнӣ„, м–ҙлЁёлӢҲк°Җ к°–кё° мӢңмһ‘н•ң мҡ°мҡён•ң мһ лІ„мҠ¬кёҲ лӢӯмһҘ м•„лһҳлЎң мҲЁм–ҙл“Өм–ҙ мӣҖм§Ғмқј мӨ„мқ„ лӘ°лһҗлӢӨ.вҖңм•ј м–ҙл¬ҙмқҙлҠ” м•Ҳ мҳӨлҠ” кІҒлӢҲк»ҙ?вҖқвҖңлӘҪмң лі‘ м•“лҠ”лӢӨ м№ҙлҠ” л§җмқҖ м–ҙл¬ҙмқҙк°Җ нғқлҸ„ м—Ҷмқҙ м§Җм–ҙлӮё л§җмқҙмӢңлҚ”вҖқн•ң мҶҗмқ„ лҶ“м•„мӨҖ кІғмқҖ лӮҙмһ…м—җм„ң м–ҙлЁёлӢҲк°Җ к·јмІҳм—җ мҷҖ мһҲлӢӨлҠ” лӘ©л©ҳ л§җмқ„ л“Јкі лӮңвҖңн”јкіӨн•ң м•„мқҙлҘј л‘җкі лі‘мғүмқҙлқј мәҗм„ң лҜём•Ҳн•©лӢҲлҚ”.вҖқвҖңмқҙлҰ¬ мҷҖлҙҗ.вҖқм—ҶлӢӨкі мҶҚмңјлЎң лӘҮ лІҲмқёк°ҖлӢӨм§җмқ„ н•ҳмҳҖм§Җл§Ң к°ҖмҠҙмҶҚм—җ лҸ„мӮ¬лҰ¬кё° мӢңмһ‘н•ң л‘җл ӨмӣҖмқҖл§җлЎң лӘЁлҘј мқјмқҙлқј м№ҙмқҙ. мқҙмӣғ мӮ¬мҙҢ мўӢлӢӨлҠ”кё° лӯҗлЎң? мқҙлҹ° м–ҙл Өмҡҙ мқјмқҙ мһҲмқ„л•ҢлҠ”м—…ліөмқ„ м•ҢлӘёмқҙл“ңлҹ¬лӮ л•Ңк№Ңм§Җ кұ°м№Ём—ҶмқҙлІ—м—ҲлӢӨ. м „лқјмқҳ лӘёмқҙмҷ„лІҪн•ҳкІҢ л“ңлҹ¬лӮ кі„мӢ¬мқҖ м§Җ진계мҷҖк°ҷмқҙ мҳҲлҜјн–Ҳ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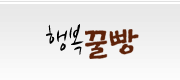
- кІҪлӮЁ нҶөмҳҒмӢң нҶөмҳҒн•ҙм•ҲлЎң 333 (мӨ‘м•ҷлҸҷ 1мёө м җнҸ¬) l TEL : 055-643-9065
- мӮ¬м—…мһҗл“ұлЎқлІҲнҳё : 612-11-60879г…ЈлҢҖн‘ңмһҗ : к№Җмў…м„
- нҶөмӢ нҢҗл§ӨлІҲнҳё 2012-кІҪлӮЁнҶөмҳҒ-00045нҳё
- Copyright © 2012 н–үліөкҝҖл№ө(н–үліөкҪғнҷ”мӣҗ). All rights reserved.






